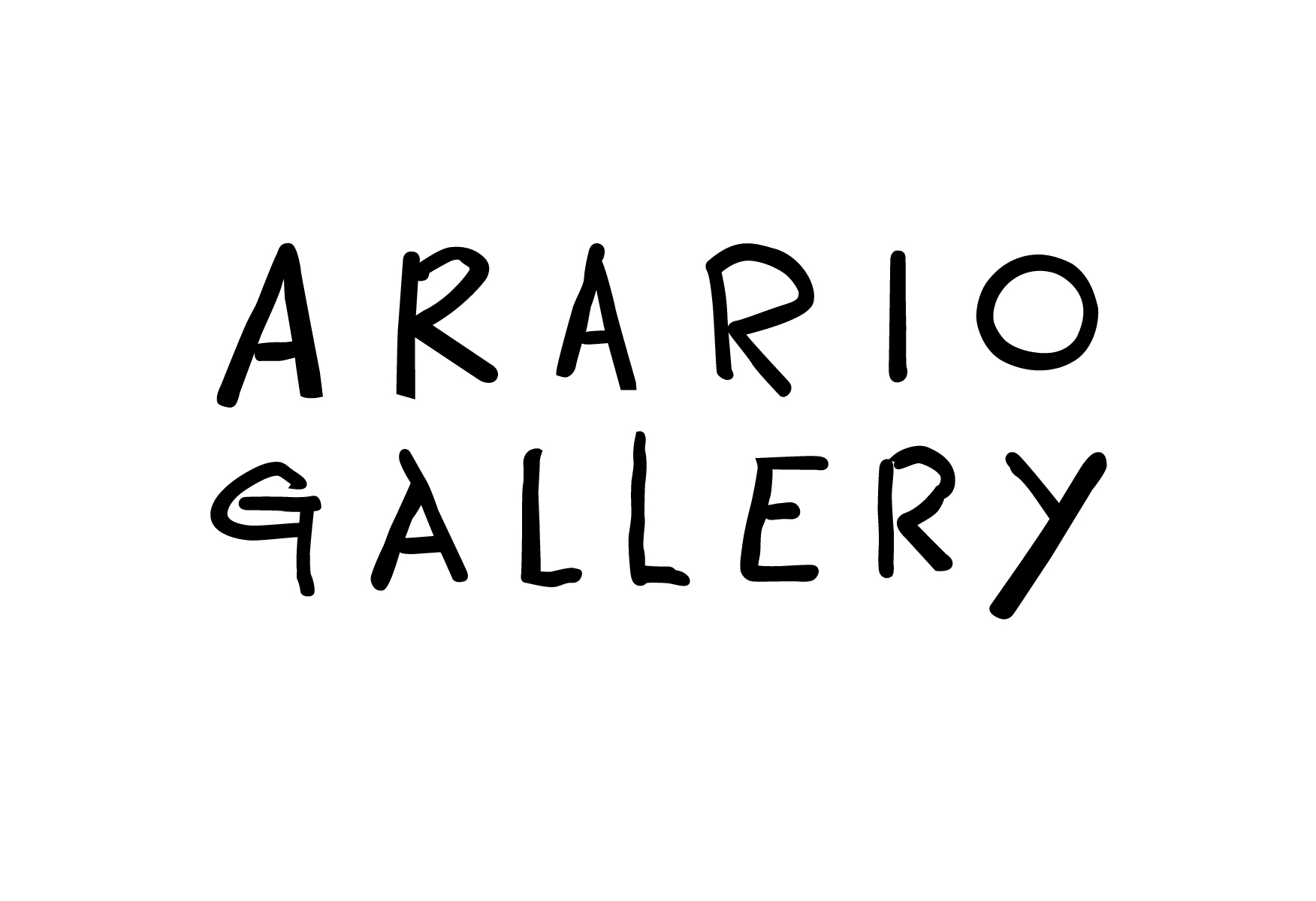KIM Jaehwan
‘일상’과 ‘환상’ 사이의 무중력 공간
글. 이대범(미술평론가)
역사의 한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등장한 신세대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근간으로 ‘환상’과 ‘일상’을 호출했다. ‘환상’은 역사적 현실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휴먼의 엽기적인 상상력으로 전개했으며, ‘일상’은 지난 세대에서 공적인 현실 규범에서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던 삶의 미시사를 저인망(底引網) 방식으로 기록했다. 현실 너머에서 우주를 지향했던 ‘환상’과 철저하게 현실에 집착하며 지하 세계를 지향했던 ‘일상’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서조차 공존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다.
‘일상’으로 ‘환상’을 조립하다
‘유사 조각’으로 보이는 김재환의 작업 지점은 애매하다. 극단으로 달려가는 다른 이들과 달리 ‘환상’과 ‘일상’의 중간지점에서 변신술을 펼친다. 그의 작업은 때로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실상은 무중력 상태인 양 극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다. 전통적 나무 조각상처럼 보이는 그의 작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적 오브제의 조합이다. 그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었지만, 관심(혹은 호기심)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무용(無用)의 물건이다. 김재환은 이러한 오브제를 수집한다. 그렇다고 그가 무엇인가를 ‘제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브제를 의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기록하듯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오브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집한다. 오브제의 일면을 살펴보면, 그의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나무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철판, 유리, 석고, 스펀지, 원형 쇠 등이 있다. (실제로, 작업실에 놓인 그의 작품은 작업실 주변 오브제와 어울려 어디까지가 그의 작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상’의 차원에서 작가의 시선에 의해 수집된 오브제는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환상’의 차원으로 전이한다. 2006년 브페인팩토리 개인전에서 김재환은 나무로 말끔한 인형을 제작했다. 인형의 몸통은 열려 있으며 그곳에는 인간의 장기와 유사하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나 인간과 무관한 ‘상상적으로 고안한 기계 장치(톱니바퀴와 도르래)’가 인형의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작업은 나무를 ‘조각’하기보다는 자극에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조립’된 것이다. 오브제와 오브제를 ‘조립’ 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한 치의 어긋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오브제 자체가 주요하다기보다는 오브제와 오브제가 만들어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중요하다. 기계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원리를 합리적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번 전시 역시 나무는 그의 작업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표정한 인형 역시 등장한다. 이러한 유사성 속에 이전 전시와 극명한 차이가 내재하여 있다. 이번 작업은 나무가 곧 인형이었던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인형의 형상을 완성하려면 나무 이외의 오브제가 필요하다. 팔의 자리에는 유리가, 목 부분에는 쇳덩어리가, 몸통에는 스펀지가 있다. 일상의 오브제가 작가의 개입을 받지 않은 오브제 그 자체의 모습으로 놓인다. 그 결과 분명한 것은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체계는 작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대신 그 자리를 ‘일상’에서 자신의 시선을 담아내 수집한 오브제가 수집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자리한다. 즉, ‘조립의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 오브제에 가해졌던 작가의 개입이 축소된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개입이 축소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답을 내리려면 작가의 개입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전 작업에서 김재환은 일상의 오브제에 개입하여 기계장치를 만들었다.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나무 인형을 인간을 넘어 ‘환상’ 지향하는 기계인형으로 변모시켰다. 이 지점은 ‘일상’이 ‘환상’으로 재구성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방점이 ‘환상’에 두면서 ‘일상’과 ‘환상’의 중간 지점에 있기는 하지만 ‘환상’으로 치우쳐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유영하지는 못했다.
무중력 공간에서 시작한 자유로운 유영
여기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나무 인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를 한 작업에 눈에 들어온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 형상이 특정 도구를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자세히 보면 작가는 그것을 ‘조립’한 것이 아니라 구축했다. 주목할 것은 이 작업에서 오브제 자체가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 작업에서 오브제와 오브제의 논리적 귀결점을 작가가 제시했다면, 이제는 오브제와 오브제가 상호 의존하면서 스스로 논리적 정당성을 찾는 것이다. 오브제는 더 이상 ‘환상’을 조립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애초 무용의 상태에서 머금은 작가의 시선을 뿜어내고 있다.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그래서 관객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형상의 오브제를 만드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작가 본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오브제에 내재하여 있다. ‘환상’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일상’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작가가 수집하여 구축한 오브제 고스란히 녹아있다. 생각해보면, 김재환의 작업은 ‘일상’이 있으므로 ‘환상’이 존재했고, ‘환상’이 있으므로 ‘일상’이 완성되었다. 이제 김재환은 ‘일상’과 ‘환상’ 사이에 만들어진 무중력 공간에서 자유롭게 유영을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