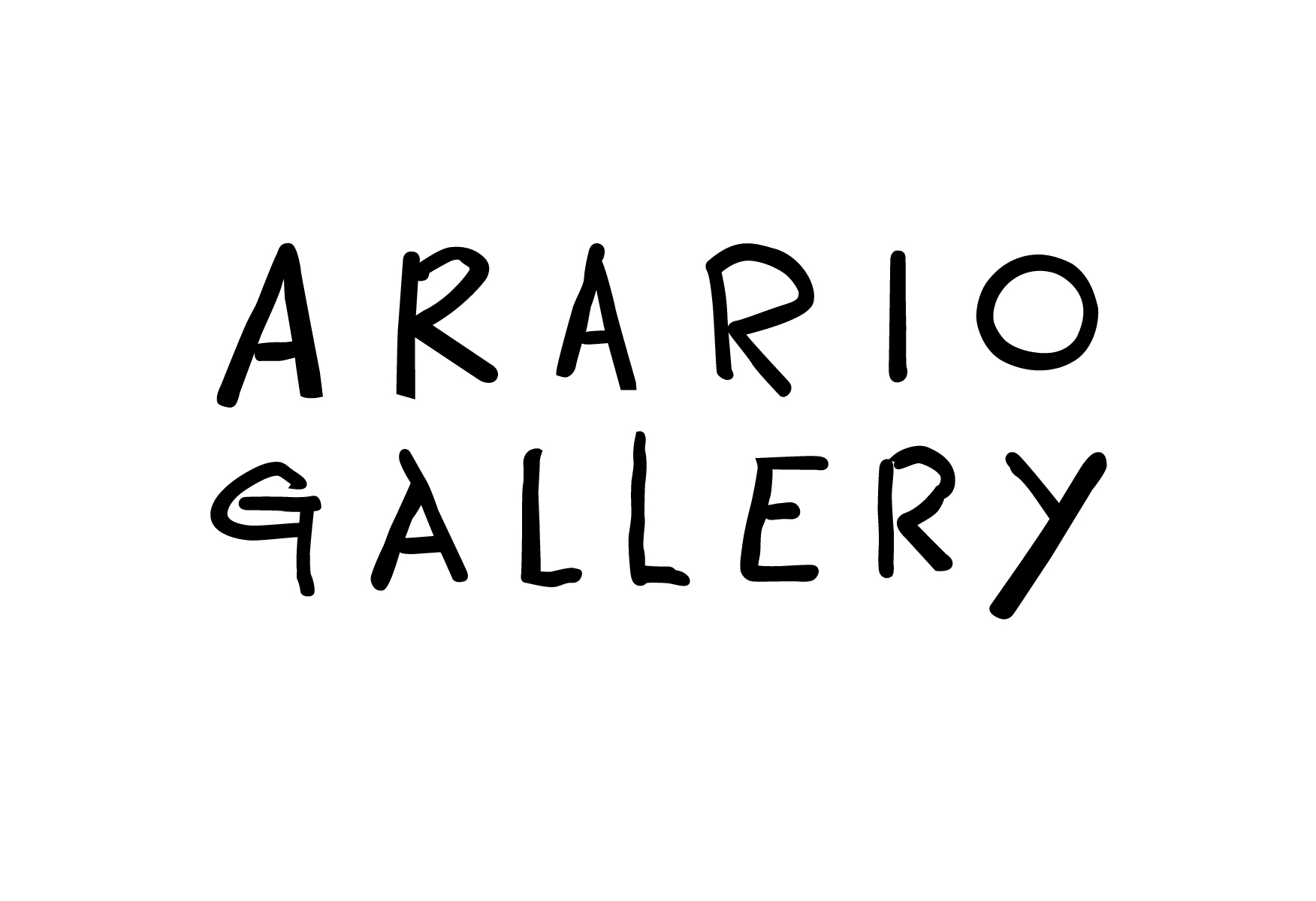화가 정강자(1942~2017)는 ‘센 여자’이거나 ‘야한 여자’로 대중에게 인식됐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다. 2000년대 들어 뒤늦게 한국 실험미술의 최전선에 섰던 정강자의 예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된 연구와 평가는 부족한 상태다.
돌이켜보면 정강자의 예술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었다. 한국 최초의 누드 퍼포먼스 ‘투명풍선과 누드’(1968)로 남성중심적 시선과 가치관에 도전하고, 작가들이 모래 구덩이에 들어가면 관객들이 한강물을 퍼붓는 ‘한강변의 타살’(1968)로 기성 미술계를 비판했다. 첫 개인전 ‘무체전’(1970)에선 그림이 없는 관람자 참여 예술을 시도했지만 당국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그의 예술은 독재 시절의 경직된 한국사회, 가부장적 사회에 수용되기엔 너무 앞서갔다. 정강자는 1977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났다.